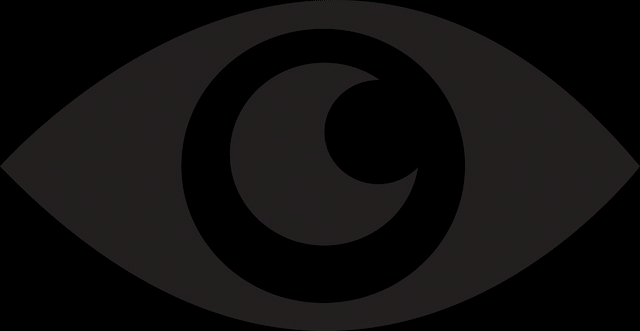(실화) 아버지를 따라온 친구분

아직 어렸을 때의 일이다.
열 살? 아니, 그보다는 더 컸었던 것 같다.
어느날 밤 아버지께서 집 밖으로 나가셨다.
어지간하면 늦은 시간에는 잘 나가지 않는 분이라 무슨 일인가 싶어 조금 놀랐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친구분이 돌아가셨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장례식을 가는 것이라고.
오늘은 아마 거기서 주무시고 오실 거라고 하셨다.
집이라는 공간에 가족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비는 것은 생각보다 무서운 일이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일인데 그 때는 그 빈자리가 낯설고 어색했다.
무언가 크게 부족하고 불안정한 느낌이었다.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다음날이 되어서야 아버지는 돌아오셨다.
드디어 빈자리가 채워져 기분이 좋아졌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편치 않아 보였다.
친한 친구가 떠난 것이니 그 슬픔이 작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때는 그런 걸 잘 몰랐다.
그저 아버지의 낯빛이 어두워 좋아졌던 기분이 다시 가라앉았다는 것만 기억난다.
왠지 슬프고, 조금 무서웠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느새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와있었다.
언제부터 그런 것인지 눈치채지 못했지만 사실 아버지께서 우울했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
아버지의 친구분 일도, 장례식도 다 잊고 있었다.
원래 아이는 그런 법이다.
며칠의 시간이 지났다.
아마 친구분 장례식 이후로 일주일 정도였던 것 같다.
아버지의 낯빛이 다시 어두워졌다.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겨우 잠이 들어도 툭하면 깼다.
그렇게 깨고 나면 한동안 멍하니 앉아 계셨다.
잠이 부족한 탓인지 깨어있는 시간에도 멍하니 계실 때가 많았다.
기척도 없이 멍하니 계셔서 계신 줄도 몰랐다가 깜짝 놀라기도 몇 번 했다.
그런 아버지가 조금 무서웠다.
다시 또 일주일 정도가 지났다.
벌써 친구분 장례식에 다녀오신 지 이 주 정도가 지났다.
그 사이 아버지는 점점 더 수척해지셨고, 정신이 깨어있을 때보다 멍한 시간이 더 많아졌다.
이러다 정말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매일 불안했다.
뭐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자다가 울기도 했다.
그리고 정말로 큰일이 났다.
“어머나! 여보!”
밤중에 들리는 어머니의 비명소리.
깜짝 놀라 안방에 가보니 아버지의 몸이 공중에 떠있었다.
누워있는 상태로.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괴로운 듯 얼굴을 찡그리고.
바닥에서 5cm 정도 아버지의 몸이 떠있었다.
어쩌면 잘못 봤을 지도 모른다.
너무 무서워서 멋대로 착각하거나 기억이 왜곡됐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 내 눈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몸이 떠있었다.
그런 아버지의 몸을 누르고, 어떻게든 깨우려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일어나요, 여보! 여보!”
시끄러운 난리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인지 아무 생각도 못 하고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다.
어쩌면 울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체감상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아버지는 깨어나셨다.
바닥에 등을 붙이고 누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셨다.
“어어? 당신, 무슨 일이야?”
오히려 눈물 범벅이 된 어머니를 보면서 어리둥절해 하셨다.
깨어나면 언제나 멍했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무언가 끝났다…… 라는 느낌이었다.
하루가 지났다.
생기를 찾으신 아버지는 그동안 본인이 어떤 상태였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셨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차라리 그게 낫다고 하셨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걸로 문제는 해결됐고, 불안감도 사라졌다.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꾸었다.
어두운 나루터였다.
약간의 물소리와 차가운 공기, 버드나무가 한그루 가지를 늘어뜨린 나룻터였다.
온통 새까만 세상이었지만 어디서 빛이 드는 건지 사람도 물결도 윤곽만은 뚜렷했다.
잠시 멍하니 서있으려니 끼이익 하는 나무 비틀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나룻배 하나가 왔다.
배에는 아저씨 한 분이 타고 계셨다.
“얘야, 이리 오려무나. 아저씨랑 같이 가자.”
아저씨는 배가 도착하자 내리지도 않고 손을 내밀었다.
어둠 속이었지만 무섭지는 않았다.
낯선 장소였지만 불안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따라가고 싶지 않았다.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이리 오렴, 어서. 아저씨랑 가야지.”
“안 갈 거라고요.”
“어서 이리 오지 못해!”
“왜, 왜 그러세요?”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싫다는데 왜 이렇게 강요하는 걸까.
무섭기보다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났다.
그래서 배를 힘껏 엎어버렸다.
작은 배라서 그런지 어렵지 않게 뒤집어졌다.
아저씨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얼른 도망가기 위해 돌아섰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땅에 못 박힌 듯 아무리 힘을 줘도 움직일 수 없었다.
대신 첨벙거리는 물소리와 철퍽거리는 축축한 발소리가 들렸다.
한 걸음.
한 걸음.
아저씨는 한 걸음씩 걸어와 뒤돌아 있던 내 앞으로 왔다.
“그냥! 같이! 가자니까아아아아!”
목이 졸렸다.
아팠다.
숨이 막힌 것보다도 아픔이 먼저 찾아왔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아저씨는 그 상태로 나를 끌고 배로 갔다.
또다시 한 걸음씩.
숨이 막혔다.
배가 아저씨의 화난 얼굴이 보이고, 배가 보이고, 물가에 발이 닿는다 생각한 순간.
갑자기 숨이 트이며 눈이 떠졌다.
“허억! 허억!”
막혔던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그 모습을 자세히 보시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버지께 달려가셨다.
“너! 너 한 번만 더 그 딴 거 달고 오면 죽을 줄 알아!”
싸우는 소리는 아니었다.
어머니께서 일방적으로 화를 내시는 상황이었다.
왜 그러시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단지 목이 너무 마르고, 정신이 멍해서 물이 마시고 싶었다.
“아… 으……”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지만 그보다 목이 아팠다.
목을 다친 적도 없었기에 왜 아픈 지도 몰라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다.
목에는 멍이 있었다.
목에는 성인 남자 정도 크기의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꿈에서 목을 조르던 아저씨의 손과 같은 자리였다.
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꿈에 나오셨던 아저씨는 아버지의 친구분이셨다.
아버지는 내 목에 남은 손자국을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든 것인지 그날 장례식에 참석했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보셨고, 다들 꿈에 그 친구분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친구분들에게도 다 찾아갔다가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왔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 친구분의 손을 잡지 않았고, 그러자 아직 어렸던 나에게도 왔던 모양이다.
혼자 떠나기가 외로웠던 것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는 나를 억지로라도 데려가려 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 후로 부모님은 장례식이 있어도 돈만 보낼 뿐 참석하지 않게 계신다.
-끝
트위터 소월아(@Sowola_is)님의 제보를 각색한 괴담입니다.
'실화 괴담 박제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악몽) 엄마와 캐슈넛 (0) | 2022.03.31 |
|---|---|
| (악몽) 다가오는 것 (0) | 2021.09.09 |
| (실화) 지나면 안 되는 골목 (0) | 2021.09.08 |
| (악몽) 이젠 친구잖아 (0) | 2021.07.20 |
| (악몽) 술 잔 너머의 풍경 (0) | 2021.06.24 |